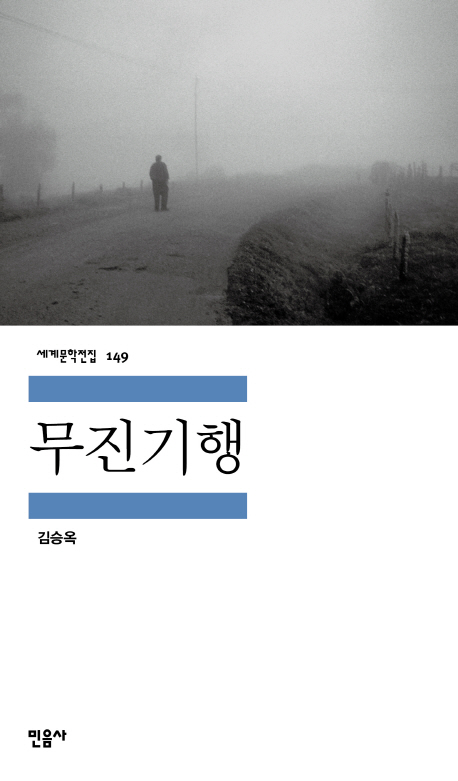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처음이라는 것에 조금은 다른 의미를 둔다. 첫사랑, 첫인상, 첫 월급, 첫아이 등등 처음이라는 것은 누구든 기억에 아주 오래 남는 법이다.
이는 모든 ‘첫’이 설렘과 긴장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상이 지루할 때 새로운 무엇인가를 기획하여 ‘첫’의 의미를 부여하고, 크고 작은 실패를 했을 때도 ‘첫’을 만드는 노력으로 삶에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도 한다.
글쓰기에서도 첫 문장은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어떤 종류의 글을 막론하고 글쓴이(작가)가 쓴 첫 문장은 앞으로 그 글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또는 어떤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는지 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첫 문장에 대한 고민은 주로 소설쓰기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인훈이 쓴 소설 ‘광장’을 예로 보자. 이 소설은 해방 이후 정치적으로 좌우대립이 심했던 시대에 살았던 어느 지식인 청년의 비극적 결말을 그린 소설이다. 혹 아직까지 이 소설을 읽어볼 기회가 없었던 독자를 위해 소설의 간략하게 줄거리를 이야기하면 이렇다.
“ 주인공 이명준은 남한 대학의 철학과 학생으로, 아버지의 친구 집에 얹혀살면서 자기만의 밀실 안에서 현실을 편협하게만 인식한다. 그의 아버지는 북한에 살면서 대남 방송(對南放送)에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아버지의 정치 활동으로 이명준은 경찰서에 불려가서 구타를 당하면서 아버지와 현재 어떤 연락이 있는가 조사를 당한다.
형사들은 그를 빨갱이로 몰아붙인다. 이를 계기로 그는 남한의 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월북을 결행한다. 그러나 북한에 도착한 이명준의 비판적 눈에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제도의 굳어진 공식인 명령과 복종만이 보일 뿐이며, 활기차고 정의로운 삶은 찾을 수가 없었다.
즉, 진정한 삶의 광장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이명준은 남과 북에서 이념의 선택을 시도했으나, 어느 곳에서도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종의 허무주의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명준은 병문안 온 국립극장 소속 무용단원인 은혜와의 사랑에서 이념의 무의미함을 다소나마 보상받지만, 그것은 개인적 삶의 한정된 행복일 뿐이고 진정한 의미의 광장은 사라지고 없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명준은 인민군으로 전쟁에 뛰어든다. 그렇지만 전쟁에서도 새로운 삶을 발견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인 은혜와 극적으로 해후하나 그녀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포로로 잡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되게 된다.
1953년 전쟁이 휴전되고 포로 송환 과정에서 남이냐 북이냐의 선택의 갈림길을 맞게 된 이명준은 중립국을 택한다. 이제 그가 나설 광장은 남쪽과 북쪽 어느 곳에도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립국을 선택한 포로들을 싣고 가는 인도의 상선(商船) 타고르호(號)가 남지나해를 지나 항해하는 어느 날 밤, 이명준은 바다에 투신하여 자살하고 만다.”
그 소설의 첫 장면은 주인공 이명준이 제3국으로 가는 배안에서 바라보는 바다이다. 작가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표현했다. 소설 광장의 첫 문장이다.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채면서, 숨을 쉰다.”
최인훈은 이 소설을 1960년에 발표했는데 이후 죽는 순간까지, 병원에 누워서도 이 소설의 결말과 문장을 수정하려고 고민하면서 작품을 발표한 이후에도 약 40년간
이 소설의 첫 문장을 11번이나 수정해서 고쳤다.
이는 이 소설은 제목은 광장이지만 그 시작과 끝은 바다다. 주인공 명준이 떠난 곳이 바로 바다였다. 광장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가는 “무거운 주제만큼이나 무거운 바다. 그래서 비늘도 육중하다” 는 뜻을 첫 문장에서 함축적이고 상징성 있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작가들의 첫 문장은 어떨까? 국내 소설 중 흡인력 있는 첫 문장으로 인정받는 소설 몇 편을 더 들여다보자.
1970년대 발표된 후 현재까지도 학생들의 기본 추천도서로 인정받고 있는 조세희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첫 문장은 이렇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였다.”
1970년대 도시개발의 이면에는 강제 철거로 보금자리를 잃고 밀려난 도시 빈민의 눈물이 있었다. 이 작품은 그들의 비참한 삶과 고통을 빼어난 문장으로 형상화하였다. 신산한 세상에 대한 비판은 화자의 이어진 문장에 담겨 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1980~90년대 한국문단의 대표 작가로 인정받던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첫 문장은
“벌써 30년이 다 돼가지만, 그해 봄에서 가을까지의 외롭고 힘들었던 싸움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그때처럼 막막하고 암담해진다.”로 시작한다.
30년이 지나고 이제는 중년의 가장이 된 사내가 초등학교 시절 교실에서 치렀던 ‘전쟁’을 회상한다. 지금도 그때처럼 막막하고 암담한 것은 그 전쟁이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벅찼기 때문이기도 하고 불완전한 승리로 끝났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1960년대 천재작가로 주목을 받았던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의 첫 문장은
“버스가 산모퉁이를 돌아갈 때 나는 ‘무진 Mujin 10㎞’라는 이정비(里程)를 보았다. 그것은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길가의 잡초 속에서 튀어나와 있었다.”로 시작한다.
주인공은 무진에서 며칠을 보내고 달라질 게 없을 삶이 기다리는 서울로 돌아가면서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잡초 속에 튀어나온 이정비는 그 부끄러움을 예고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 이정비가 잡초 속에 튀어나온 게 아니었다면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도 될 삶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첫 문장도
“늘 코를 흘리고 다녔다. 콧물이 아니라 누렇고 차진 코여서 훌쩍거려도 잘 들어가지 않았다. 나만 아니라 그때 아이들은 다들 그랬다.”로 시작한다.
이 작품은 1930년대 개성 송도 부근 박적골에서의 어린 시절과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서의 20대까지를 그려낸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다. 작품 속에 펼쳐진 굴곡진 현대사와는 별개로 유년기의 어린이라면 당연히 콧물 닦는 손수건을 가슴에 달고 초등학교 입학식에 가던 어리숙한 시절에 대한 회상은 정겨운 데가 있다.
단순한 생활 글 하나를 쓸 때도 우리는 어떤 문장으로 시작할까 고민한다.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고 내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문학 작품이라면 난이도가 더 높아진다.
매력적인 첫 문장은 진부하지 않고 신선하면서 모티브를 제공하거나 주제를 암시하고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독자를 사로잡아 작품 속으로 초대한다. 첫 문장이 독자를 끌어당긴다면 그 작품은 이미 반은 성공한 것이다. 강렬한 첫 문장에 매료되는 것은 독서 과정에서 받는 맛난 선물이기도 하다.


